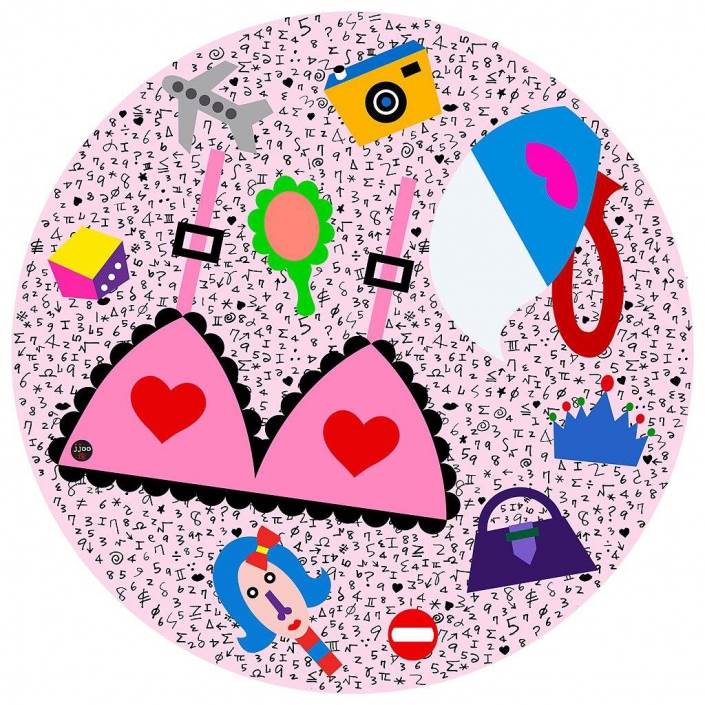박경주 개인전 – X-PLAY
2017. 10. 10 – 10. 29
박경주전 <현대인들을 위한 판타스마고리아의 사물들>
박경주는 사물을 만든다. 의자, 아이스크림, 성냥개비, 손거울, 구두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기에 무감각해진 사물들이다. 작가는 사물을 현실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형태, 무게, 질감, 크기, 색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가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사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물에 대한 편견에서 크게 이격되지 않고 닮음을 유지한다. 이것이야말로 박경주의 사물들이 낯선 색과 크기를 지녔어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러나 관람자들은 금새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순적 사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신화적인 세계에서 왔음을 알아챈다. 그리고 자신이 지녀온 사물에 대한 감각,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재빠르게 연결하고 낯선 것과의 차이를 묻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에 침입하며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직감한다. 만약 이 과정 속에서 관람객이 호기심보다 이질감과 당황스러움을 깊이 느낀다면, 작가가 의도하는 관람자들의 환상세계에 대한 몰입과 동참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작가가 종당 환상세계를 통해 취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유쾌한 위로와 치유는 관람자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개입과 동참이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 환상세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진화하기 위해서는 관람자가 끊임없이 타자의 몰입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원초적인 촉각/시각 놀이다. 놀이의 몰입과 흥미에 매료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아의 피부가 탐지한 리비도의 인도 아래 새로운 세계와 접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에서 놀이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박경주의 환상놀이는 점차 평면적인 세계에서 회화와 입체가 결합된 세계로, 그리고 공예와 예술이 결합된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 : 세계는 원래 요술환등기로 펼쳐지는 꿈의 세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광학적인 효과나 환상적인 세계에서 경험하는 총체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유하여 지칭한다.)적 세계로 진화하고 있다. 박경주의 판타스마고리아적 세계는 수동적 몰입에 반대되는 적극적 수용 즉, 체험과 촉각적(taktill)행위로 채워지고 진화한다. 촉각은 몸을 움직여 사물의 구석구석을 더듬고 돌아다니며 그 기억을 몸에 각인시켜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흙을 주무르고 형태를 만들며 유약을 바르며 경험과 감정을 극대화한다. 무유/시유, 고온/저온을 구별해 도자기를 굽고 이 위에 유리나 글리터 파우더, 전사지 등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는 것도 자신의 촉각유희를 유영하는 나르시시즘의 과정이자 스스로 창작의 동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이다. 작가는 물질을 대면하고 그를 더듬고 관찰하며 재료와 수법의 조합으로 가능한 수많은 가벼움과 무거움, 부드러움과 거침, 광택과 무광택, 얇음과 깊음 등의 차이를 실험한다. 그후 초감각의 시편들을 자신의 공간에 채워 넣는다. 이 같은 감각의 경험은 마치 어린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눈을 반짝여 세상을 인지하는 원초적 과정과 닮아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원초적 상태로 회복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속도, 자본논리가 유발하는 부조리함과 무거움에 억눌린 자들이 일상 속에서 유희의 감정과 기억을 회복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을 환상으로 바꿔줄 신비한 판타스마고리아적 사물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박경주가 만들고 그리고 타 재료를 붙여 완성한 렌디큘러, 세라믹과 나무가 결합된 스툴, 거울, 보울(bowl) 등은 현실을 환상세계로 바꿔주는 매개물들이다.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계, 자본, 속도에 의해 점차 파타피지컬(pataphysical: 20세기 중반 형이상학(metaphysics)의 패러디로서 등장한 학문 ‘파타피직스 (pata physics)’는 초현실주의와 초합리주의의 중요한 원리였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인해 가상과 현실, 은유와 실재가 구별불가능하고 모호해진 중첩의 상태를 지칭한다.) 해지는 현실을 바꾸거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현실을 스스로 유토피아로 조금씩 바꾸며 끝없이 그 속에서 탈신체화, 탈경계화를 끊임없이 도모하는 일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홍지수 I 공예비평, 미술학박사, 홍익대 학술연구교수